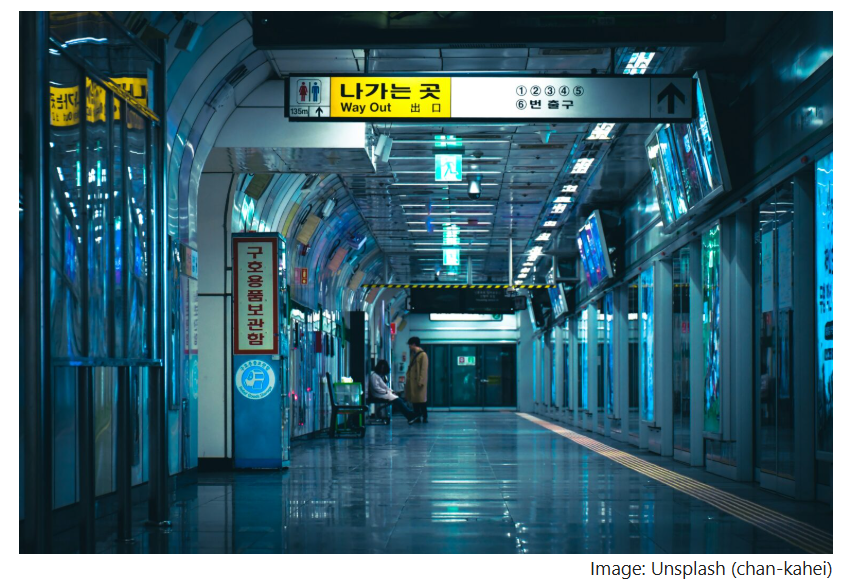이동의 자유, 혹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 이 글은 오랜 기간 해외 생활을 거친 한 개인의 시선으로 본 서울 대중교통에 대한 관찰 기록입니다. 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경험에 기대고 있으며, 모든 한국 도시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잘 느끼지 못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버스를 갈아타며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늦은 밤에도 큰 걱정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 그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굳이 생각해 볼 이유조차 없었다. 요금을 다시 계산하지도 않았고, 이 시간이 위험한 시간인지 스스로에게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때의 나는 이 도시의 속도가 숨이 막힌다고 느꼈다. 왜 이렇게 늘 시간에 쫓겨야 하는지, 왜 모든 것이 이토록 타이트하게 돌아가는지. 바깥세상의 ‘여유로운 사회’나 ‘느긋한 삶’ 같은 말들이 훨씬 근사해 보였다. 그러다 어느 날, 직접 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서 본 ‘여유’의 다른 얼굴
처음에는 그 낯섦이 좋았다. 기차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크게 놀라지 않는 풍경, 버스가 오지 않으면 그저 다음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 그것은 분명 여유로운 삶의 한 단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유의 이면에 숨겨진 다른 장면들이 겹쳐지기 시작했다. 언제 올지 몰라 이동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피로감, 이 거리와 이 시간에 굳이 밖으로 나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선택들. 밤이 되면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고, ‘오늘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안전에 대한 긴장이 있었다. 이어폰을 끼기 전 주변을 살피고, 자리를 고를 때조차 몸이 먼저 기민하게 반응한다.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이동은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걸.
비용을 묻지 않아도 되는 국경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기 전 이동 비용을 먼저 떠올리는 일이 드물다. 조금 멀어도, 하루에 몇 번을 갈아타도 그 선택이 마음의 부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동은 계획의 일부이지, 결정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이 감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어디를 가기 전 ‘이만큼의 돈을 써도 괜찮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상. 이동이 잦아질수록 활동은 줄어들고, 도시는 넓은데 삶의 반경은 오히려 좁아지는 역설을 경험했다. 이 부담 없는 요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개인이 도시라는 공동체를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입장권이었다.
문제는 교통이 아니라 그 위의 삶일지도 모른다
출근 시간의 혼잡함과 숨 막히는 밀도는 분명 실제 하는 피로다. 하지만 이것은 대중교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역설적인 증상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회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미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기다림과 포기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된다. ‘여유’라는 이름 아래 정시성과 안전이 뒤로 밀려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의 이동에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과 일정한 밀도가 실려 있다. 약속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 보이는 것들
한국의 대중교통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이 정도의 신뢰와 안전, 그리고 비용 부담 없는 접근성이 동시에 유지되는 구조는 세계 어디에서도 흔치 않다. 안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고, 밖에 나와서야 또렷해진 진실이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할 ‘정상성’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바라볼 가치가 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그들이 누리는 이 무심한 평온함이 얼마나 거대한 사회적 자본 위에 세워진 것인지 새삼 실감한다.